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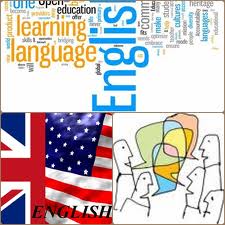
학기를 끝내면서 한국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종강파티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영어 때문에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학생이 ‘세븐 일레븐’ 이란 잡화상에서 일하다가 경험했던 일을 말하였다. 미국에선 술을 팔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보고 나이가 21세가 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팔 수 있는데 고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맥주 6깡통을 들고 와 계산대에 놓더라는 것이다. “신분증 볼 수 있습니까?” 고 했더니 이 아이의 눈이 돌아가면서 “아니 루트비어(root beer)를 사는데 왜 신분증을 보여야 하는데?” 라고 우기더라는 것이다. 자기는 그 때 루트비어가 콜라 같은 소다수인줄 모르고 “술을 사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비어(root beer)라고 쓰여진 것 안보이세요?”라고 우겼다는 것이다. 결국 손님이 고개를 설래 설래 저으면서 돌아갔는데 나중에야 루트비어가 술이 아닌 것을 알고 나서 무척 당황했다는 말을 했다. 허기사 나도 처음엔 루트비어가 생맥주인줄 알고 기숙사에서 닭튀김을 먹을 때 한꺼번에 여섯 잔이나 따라와서 억지로 마신 일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었다.
옆에서 듣던 대학원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건전지를 사러 잡화상에 들어갔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점원에세 “빳데리 플리즈” 했는데 “뭐라고요?” 하며 못 알아듣더라는 것이다. “아! 미국은 영어발음의 엑센트가 뜻을 완전히 다르게 하지!” 라는 말이 생각나 ‘빳’자에 엑센트를 넣어 “'빳’데리 플리즈”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것이다. 다음에 ‘데’자에 엑센트를 넣고 “빳'떼에'리 플리즈” 라고 해보기도 하고 ‘리’자에 엑센트를 넣어 “빳데'리이’ 플리즈” 라고 엑센트의 조합을 모두 구사해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냥 돌아온 경험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누가 ‘베러리’라고 하는 줄 알았나요” 하며 웃었다. “그 말이 맞어. 난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면서 엑센트를 한 자씩 다섯 번을 옮기며 다 발음해도 잘 못 알아들어 결국 카푸치노를 시킨 일이 있어” 라며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동의했다.
엑센트로 고생한 이야기는 누구나 한 둘 가지고 있고 또 본국에서 쓰던 영어가 미국에서도 같이 통용되리라 생각하고 말하다가 전혀 통하지 않아 당황한 때가 많기 때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곳 대학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방문교수가 자기도 영어 때문에 당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미국에 도착하면 초청하는 학과의 교수가 비행장에 와서 자기를 대리고 숙소를 찾아주기로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아무도 마중 온 사람이 없었다. 짐을 찾고 나서 공중전화에 가서 마중오기로 한 교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동전을 써서 전화를 하는 법은 배우고 왔노라고 했다- 어떤 부인이 전화를 받더라는 것이다. 교수 부인이구나 생각하고 “남편을 바꿔 주십시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 그래서 “Change your husband” 이라고 말했더니 받는 쪽에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 있더라는 것이다. 얼른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예절도 지키지 않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다시 전화를 걸어 “Change your husband, please” 라고 했다는 것이다.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는 말을 “남편을 갈아치워” 아니면 “제발 남편을 갈아치우세요” 라는 말로 했으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나 하겠는가? 아무튼 변죽이 좋은 이 교수님은 “A C” 하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서 주무셨다고 했다. 나중에 그 과의 교수가 도착 장소를 잘못 알고 다른 곳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선 그럴 때 뭐라고 하지요?” 라고 물어보았다. 앞에 있던 교수 한 분이 “Thank you very much” 라고 하지요 라고 대답해서 한바탕 웃었다. “남편 갈아치워”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미국에선 개들도 다 알아듣는다는 영어가 왜 그렇게 힘든지 중, 고, 대학에서 1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도 미국에 온 분들은 영어를 힘들어한다. 식당에서 뭘 하나 시켜도 왜 그렇게 따로 주문하는 것이 많은지 식당 가기가 두렵다고 하며 주로 뷔페형 식당을 찾는다. 계란을 하나 시켜도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하면 오버이지 , 스크램블드 에그, 서니사이드 업, 삶은 계란, …등등 에서 시켜야 하는데... 요리에 따라오는 샐러드에 넣을 샐러드 드레싱의 종류가 수 십 가지인데 “어떤 드레싱을 원합니까?” 하면 못 알아듣고 “예스, 예스” 라고 만 하는 사람을 보면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냥 옆 사람이 먼저 주문하게 하고 “똑 같은 것” 이라고 하라고 말이다. 햄버거 가게에 가도 햄버거 속에 뭐를 집어놓느냐 하며 이것 저것 묻기에 돈을 더 받으려나 싶어 다 노! 라고 만 대답했더니 나중에 나온 것을 보니 아무것도 없이 햄버거 고기와 빵만 나오더라고 열 받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 할 때는 손짓 발짓 또는 표정으로 이야기가 통하지만 전화로 통화해야 할 땐 무척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 갈아 치워” 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말이다. 그래도 자꾸 시도하면서 조금씩 배우는 수밖에 없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닐까?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오래 있어도 결국 영어를 못 배우고 돌아간다. 이런 사람이 귀국해서 미국사람을 만나면 친구들이 “넌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왔으니 통역 좀 해라” 라고 하겠지? 혹시 통역한다고 해서 말하다 못 알아듣고 “이 사람 텍사스 사투리가 너무 심하네. 난 표준 영어만 배워서…”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더보기 >>> http://imunhak.com/wessay/3788